내 이름은 공벌레
- 퐁당 에디터
- 2019년 8월 20일
- 2분 분량
사람을 알아가는 일은 때때로 퍼즐 맞추기 같다. 어떤 이는 백 피스 퍼즐처럼 단순 명료하다. 또 어떤 이는 만 피스 퍼즐처럼 복잡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오래 인연 맺다 보면 모호했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상대가 한 점의 완벽한 그림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퍼즐은 미완성인 채로 남는다. 너무 복잡해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퍼즐 조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기 퍼즐 조각을 꽉 움켜쥐고 끝내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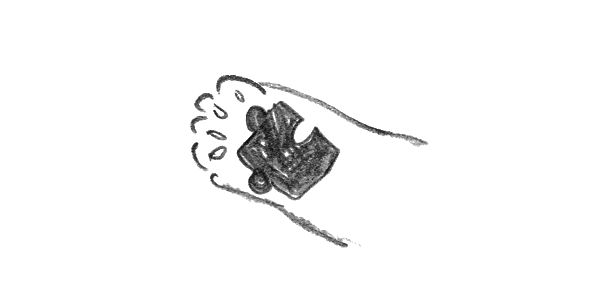
내가 다녔던 유치원에는 장난감으로 가득 찬 인형의 집이 있었다. 네댓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만큼 꽤 넉넉한 크기였다. 쉬는 시간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 작은 영역 다툼을 벌였다. 오늘은 누가 인형의 집을 차지할까 승자를 지켜보는 일은 늘 흥미로웠지만 애초에 그 집의 주인이 될 생각은 없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면 그제야 조심스레 살짝 들어가 둘러보는 게 고작이었다.
대신 나에게는 ‘그 녀석들’이 있었다. 놀이터 그늘 축축한 나뭇잎 몇 장을 들추면 있던,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동그랗게 몸을 말아버리는 공벌레들. 얘들은 언제쯤 다시 빼쭉 얼굴을 내밀까 기다리는 일은 내 즐거움 중 하나였다.
짝과 손잡는 게 어색해 나뭇가지 한쪽 끝을 내밀던 아이.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바지를 적셔도 선생님께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교실에서 도망쳐버렸던 유년의 나는 공벌레였다. 누가 머리라도 건들면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다가 주위가 조용해지면 살짝 실눈을 뜨는. 그때의 나는 누군가 '나'라는 작고 초라한 퍼즐을 맞출까 봐 두려웠다. 나를 들여다보려는 타인에게 날을 세우며 손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부끄러운 내 한 조각을 꽉 움켜쥔 채 지냈다.

그랬던 내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내게 말 걸어준 이들 덕분이다. 내 일기에 항상 길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오리엔테이션 가는 버스 안에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고 먼저 물어봐줬던 대학 동기 소현이, 무뚝뚝함과 불친절에도 항상 먼저 마음을 내주었던 사람들 덕에 나는 작은 공벌레에서 제법 큰 인간이 되었다.
아직도 이따금 어린 시절의 공벌레로 돌아가고 싶어 움찔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한다. “인생을 한 점의 그림이라고 생각해봐. 화폭 크기나 화려한 붓놀림이 무슨 상관이야? 그림의 수준이나 화풍이 뭔 대수? 네 인생은 공모전 출품작도, 옥션 경매품도 아니잖아. 그냥 열심히 그리기나 해.”
글. 스피치라이터 류송아
👉 삼성디스플레이 커뮤니케이션팀에서 9년째 스피치라이터 일을 맡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