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식물 다반死 1
- 퐁당 에디터
- 2020년 1월 31일
- 3분 분량
이상하게 자꾸 죽어나간다. 비극이 자꾸 일어나는 까닭은 뭘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다. 에둘러 이야기하는 내 스타일을 모르시는 독자님께서는 둘러둘러가는 이야기임을 사전에 주지해주시길. 말하자면 서설이 기니, 부디 참을성을 가져주시옵소서 하는 말이다.
내겐 이상적인 ‘홈 스윗 홈(Home Sweet Home)’의 모습이 있어 왔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6살까지 시골에서 살았던 영향인지도 모르겠다. 공부 안하고 논으로 밭으로, 강과 산으로 마구 뛰어놀던 천둥벌거숭이 시절이었다.돌아보면 지금껏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던 듯 하다. 그런데 그 때의 풍경을 그려보면 가장 먼저 그려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꽃과 나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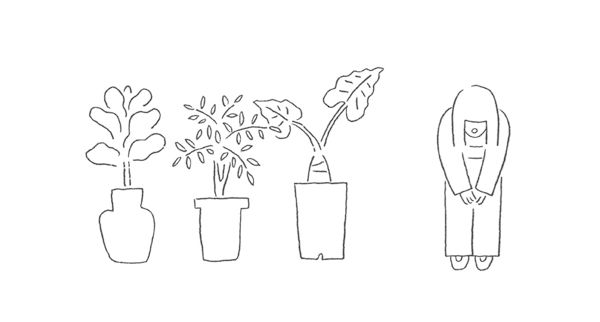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참 부지런하셨다. 사철 내내 앞마당에 무언가를 바지런히도 심었다. 모란, 채송화, 장미가 해마다 활짝 피었고. 늦여름이 오면 코스모스가 하늘거렸다. 수돗가에는 잘 익은 빨간 대추를 매단 대추나무 가지를 늘어졌다. 집 바로 뒤엔 마을 공동 방앗간이 있었는데, 담장과 함께 밤나무가 우리집과 방앗간터를 구분짓는 경계역할을 했다.
그 영향 때문인지 내게는 이상적인 집의 모습이 당시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었다. 적어도 마당이 있어서 나무와 꽃이 가득하거나, 아파트에 살더라도 실내에 푸른 잎이 가득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 꿈은 오랜 시간 실현되지 못했다. 결혼해 처음 신접살림을 차린 곳은 방 두개 딸린 일반 주택의 꼭대기 층이었다. 아이를 둘이나 낳고 회사를 다니고 하는 사이에 언감생심 도전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4년 전 아파트로 이사를 왔지만 거실에 풀 한포기를 키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런 전개는 늘상 입담 좋은 이야기꾼이 등판시키는 문장이 아닌가!) 일요일에 나오는 신문을 만드는 조직에 있는 관계로, 토요일 편집국을 지키고 있는데 쓰레기통 근처에서 다 죽어가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보이지 않겠는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편집국 안살림을 맡아주는 행정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토요일 8시를 넘긴 저녁이었다. 요컨대 다 죽어가는 이 나무를 버리실 요량이면 저를 주십사는 것이었다. 높이가 족히 1미터 40센티미터는 되는 듯 했다. 집에 가져가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더 큰 황망함은 따로 있었다.
집에 가는 길에 검색을 해보니 해피트리였다. 인터넷 검색 결과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물에 담가두고 뿌리를 내려 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뿌리 상태는 참담했다. 말라 비틀어져서 회생 가능성이 없었다.
눈물을 머금고 나무를 보냈다. 그러고 나니 며칠 거실에 있는 빈 화분에 눈이 자꾸 갔다. 이번엔 큰 마음을 먹고 화원으로 달려갔다. 가장 멋지게 푸른 잎을 틔우고 있는 떡갈나무를 찍었다. 꽃집 사장님이 출장 서비스로 직접 심어줬다. 이후 거실 쇼파에 앉아 푸른 떡갈나무 잎을 보면 스멀스멀 웃음이 절로 났다. 우리집 거실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좀 줄어들고, 산소도 많아져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겠지만 공기마저 상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1년쯤 지나면서 푸른 잎이 점차 사라졌다. 새잎도 나질 않았다. 떡갈나무를 허망하게 보내고,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녹보수를 들였다. 화원 사장님께서 출장 서비스를 또 해주셨다. 그리고 또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녹보수는 시름시름 가지를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고, 기어이 사망선고를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이때 포기했어야 하는데, 기세 좋게 다시 화원을 갔다. 그리고 이번엔 실내에서 잘 큰다는 알로카시아를 샀다. 화원 아저씨에게 조금 챙피한 기분마저 들어 알로카시아는 직접 심었다. 알로카시아는 이국적인 나무였다. 물을 가끔 주는데도 새 잎을 잘도 틔웠다. 일년을 넘게 버티는가 했더니 올 여름 뿌리가 썩기 시작했다.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물을 너무 준 탓이었다.
사실 이쯤되면 포기했어야 했다. 연달아 몇 그루의 나무를 죽인 것인가. 사망사건의 범인은 너무 명확했다. 빛도 바람도 아닌 물을 잘못 주고 잘 못키운 나였다. 진심으로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나무 한 그루도 못 키우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나’하는 거센 자괴감까지 들었다. 한동안 빈 화분으로 두다 오기가 일었다. 쓸데 없는 자존심 같은 것이었나보다. 지갑을 챙겨들고 단골이 되어버린 그 화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번엔 식물 좀 키우는 사람들에게 핫하다는 몬스테라를 찍었다. 사장님이 안 계신 덕(?)에 안사장님께서 출장 서비스를 해주시겠다고 해주셨다. 흙을 서너포대 오토바이 뒷자리에 싣고 달려온 사장님은 빈 화분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바닥에 포대를 깔고, 화분에 담겨져 있던 흙을 꺼내고. 가져온 배양토와 함께 이리저리 손으로 섞었다. 다시 화분에 흙을 담고 몬스테라를 보기 좋게 심으시더니 입을 여셨다. “사모님, 어디로 가져갈까요?” “아 사장님, 저 사모님 아닌데요. 말씀 편히 하세요.” 사장님이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거실에는 나무가 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나무가 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거실 앞 베란다라고 했다. ‘베란다로 화분을 가져가면 쇼파에 앉아 파란 잎을 구경하기 어렵지 않은가’란 취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되받았다. “사람이 보기 좋은 데 화분을 두면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잘 클 수 있는 곳에 둬야 죽지 않고 크죠.”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나는 그저 ‘나 보기 좋자고’ 화분들을 4년간 죽이는 짓을 반복해왔던 것이었다. 각자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여태껏 쇼파에 앉아서 보기 좋은 곳만 고집했던 것이었다. 베란다로 거처를 옮긴 몬스테라는 석달 째 잘 생존해 있다.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 멋들어진 잎을 활짝활짝 펼쳐보이고 있다. 심지어 새잎도 올렸으며 줄기에선 굵은 뿌리 줄기가 아래로 힘차게 자라나고 있다. 쇼파에선 어떻게 보이냐고? 보이긴 보인다. 하지만 멋들어진 화분의 뒷태만 보인다. 제대로 감상을 하려면 베란다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그래도 참 만족스럽다. 적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란 마음으로 나무를 키우지는 않고 있으니 말이다. (몬스테라가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얼마를 살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거창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번 식물 연쇄 사망 사건을 통해 뭔가 아주 조금 나은 인간이 되기위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 우리집 거실에서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스러진 떡갈나무와 해피트리, 알로카시아에게 머리 숙여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현예 기자
👉 중앙일보 기자. 데이터 뉴스팀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 '데이터브루' 라는 채널을 만들었다. https://databrew.joins.com/




댓글